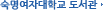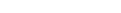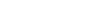15세기 후반에 함경도 영흥(永興)에서 활동한 기생. 조선 9대 성종(成宗, 1469-1494)이 베푼 궁중의 연회에 참여하여 재치 있는 행동으로 성종에게 큰 상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름을 떨쳤다.
작가가 성종 때에 궁중의 연회에 참가하여 술을 권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기존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시조 3수를 지어 불렀다. 작가는 이때 임금에게 직접 술을 권하기 어려워 영상에게 술을 권하면서 문신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다. 이때 무신으로서 병조판서가 된 자가 있어 다음 번에는 자신에게 술을 권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작가 다른 문신에게 술을 권하면서 노래를 부르자 노기를 띠었다. 그러자 작가는 무신을 추겨세우는 노래를 불러 그를 위로하였다고 한다. 차천로(車天輅)의 {오산설림초고(五山說林草藁)}에는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작가가 지은 노래를 속요(俗謠) 세 편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상에게 술을 권하며 부른 노래를 '□도 계시건마 ㅇ아 내 님인가 ?노라'라고 소개하고 있다.
이와는 달리 가집들에는 작가의 시조 세 편이 전하고 있는데, 첫째 수는 무신을 무시하고 문신을 따르겠다는 내용, 둘째 수는 무신을 따르겠다는 내용, 셋째 수는 문신과 무신 사이에 끼어 처세가 어려운 자신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내용 등 세 편이다. 고대본 {악부}에는, 작가가 지어 부른 노래가 문신만을 칭송하는 것이어서 자리에 있던 무신이 성난 빛을 보이자, 무신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이번에는 문신들이 좋아하지 않아, 결국 문신과 무신 사이에서 낀 자신의 처지를 은유한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문신과 무신이 다함께 즐거워하고 말았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다.
작가가 남긴 세 편의 시조 가운데 〈당우(唐虞)을〉, 〈전언(前言)은〉 두 편을 17세기 초에 기녀 금춘(今春)이 변형하여 〈당우(唐虞)도 친히 본 듯〉과 〈아녀(兒女) 희중사(戱中辭)〉를
지어 화답시조로 활용하였다. 작가의 시조를 익히고 있던 후대의 기녀가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다.
또한 작가의 이 세 편의 시조는 창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전에 전해지던 속요를 부른 것이라는 의심도 있다. 그것은 차천로가 {오산설림초고}에서 이 세 편의 시조를 속요라고 불렀다는 데서 연유한다. 작가는 또한 한시로는 ?〈고의(古意)〉를 남겼다.